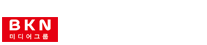▲ 박문숙 수필가/민화작가
어린 시절 외가에 가면 감나무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난 유독 감을 좋아한다. 감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선을 뵈는 단감, 말랑말랑 단맛이 혀끝을 감미롭게 하던 홍시.
첫사랑처럼, 달기도 하지만 때론 덜익은 것을 성급히 먹게 되면 떫은 맛이 오래 입 안을 가득 매워 온 가슴 속까지 답답하게 해주는 대봉. 흔히 경상도 시골에서는 도오감(동이감)이라고들 하는데 단지 속에서 익혀 먹기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리라.
감은 곶감도 참 좋다. 그냥 하루종일 곶감꼬지를 들고 오라버니들 뒤꽁무니를 쫒아다니며 하나 둘 빼먹는 맛도 맛이려니와, 설날 차갑게 약간의 살얼음이 언 수정과에 띠워먹는 그 달달함이란...,
아무튼 감은 감만이 아닌 감잎으로 우려내는 차맛은 또 그 색과 맛이 깊고 그윽하다. 이렇게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겨울방학을 맞아 외가를 가면 집집마다 배경그림처럼 초가를, 또는 기와를 이고 있는 발갛게 익어가는 감나무의 정취란!
나의 어린 시절의 풍요로운 정서는 아마 이 감과 함께 익어갔으리라.
들고온 가방을 대청마루에 던져놓기 무섭게 작은 몸으로 쪼르르 감나무 밑으로 달려들면 "아가, 까치 모가치는 남기두래이." 어김없이 날아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한참이 지나 다 큰 뒤에서야 초겨울의 감나무에 매달린 그 예쁘고 달디단 감이 까치들의 몫이고 내가 무엄하게도그 예쁜 아이들의 먹거리를 탐을 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단지 그것은 한겨울을 나야하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의 것을 침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조차도 위협한 것임에랴. 이것저것 배불리 먹고도 불쌍한 그들의 몫까지 앗아 먹으면서 살이 찌니 마니 하면서 엄살을 부려온 내 모습을 비쳐보게 된 것은 한참이 지나서 다 크고 난 뒤에서였다.
지금도 나는 겨울이 되면 시골을 찾아 가벼운 여행을 하곤 했다. 나무가지마다에 달려있는 까치밥을 보면서 우리 조상님네들의 자연과 함께 하는 넉넉하고 푸근한 사랑을 새겨보며 내 삶을 새김질해 본 것이다.
그러다 오래 전 나는, 나의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것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까치밥을 달고서 나에게 교훈을 준다. 내가 이토록 맛있어하는 무언가를 부족함 속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너를 위해 남겨본 적이 있는가? 내 몫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로 인해 너에게 보탬이 된 적이 있었던가?
이제 나의 삶도 늦가을을 맞았고 겨울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주변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내 나이 만큼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 아픔의 시인 천상병은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이번 소풍에 까치밥 잘 나눠주고 왔어."라고 슬그머니 웃을 수 있기를 염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