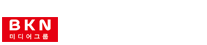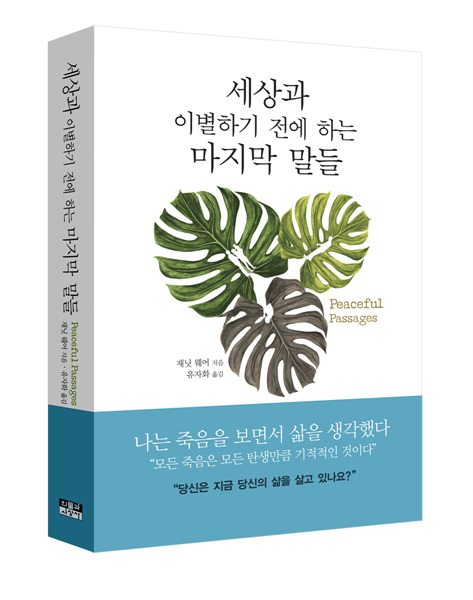 |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간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잃을 것이고, 부부는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뒤에 혼자 남겨질 것이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임종 환자가 삶의 벼랑에 섰을 때, 그들이 평화롭게 죽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임종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임종을 맞는 사람이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야 한다. “당신이 가버리면 많이 그리울 거예요”와 같은 솔직한 심정이어도 좋다. 아니면 덜 분명하고 덜 고통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떤 식이 되었든 그 표현에는 ‘나는 당신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라는 의미가 담겨야 한다. 이런 말이 전환점이 되어 임종 환자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들』은 저자가 임종 환자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정리했는지, 그들이 죽음의 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삶과 죽음’에 대한 감동과 성찰의 에세이다. 또한 저자가 죽음의 여정을 배웅하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는 모습과 그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엿본 기록이다.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에게 그 경험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그의 죽음을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보내주는 것은 중요하다. 종신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저자는 자신의 삶을 달리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다. 생명의 끈이란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유한한지 말이다.
저자는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 곁에서 보낸 그 수많은 세월을 겪고 나서 절대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생을 다 산 다음 그 너머에서 죽음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경험으로 확장하거나 징검다리처럼 건너는 다리 같은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직 맞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모든 탄생만큼 기적적인 것이다. <출판사 서평 中>
■ 지은이 소개 - 재닛 웨어(Janet Wehr)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 하이츠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나, 삶의 대부분을 시카고 교외에서 살았다. 그녀는 간호사(registered nurse)로 22년을 일했고, 그중에 17년은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데 바쳤다. 현재는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 돌봄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조직인 하버라이트호스피스(Harbor Light Hospice)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 of America), 치유적접촉국제협회(Therapeutic Touch International Association), 미국홀리스틱간호사협회(American Holistic Nurse’s Association) 회원이다. 일리노이주 뒤파제카운티의 노숙자를 위한 자선단체인 사렛자선기금(Saret Charitable Fund) 이사회에서도 활동한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일리노이주 롬바드에서 살고 있으며, 성인이 된 세 자녀와 두 양자녀를 두었으며, 손자와 손녀가 여덟 명이다. 자연과 정원 가꾸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남편과 함께 위스콘신주에 직접 지은 산장에 찾아가 종종 고독을 즐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