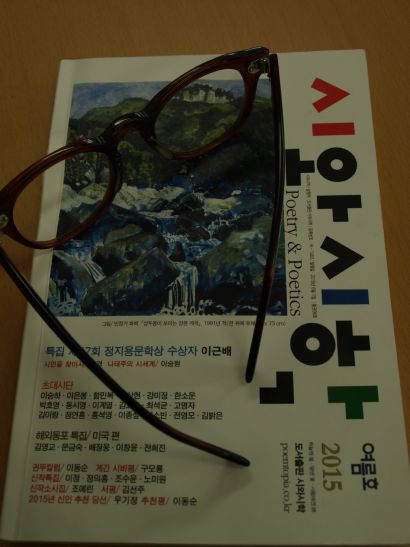
한 시인이 사라졌다. 그 시인은 평생 허공같은 시를 썼다. 시가 밥이 되지 못할진대 그래도 그 길을 스스럼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걸었다.
시지프스의 바위 굴림처럼 삶이 쳇바퀴 돌 듯해도, 그는 우직하게 시의 길에서 시를 호흡하며, 시와 함께 살아, 시를 노래했다.
태풍이 천지를 휩쓸어도, 폭우가 쓰나미가 되어도, 그 결기는 시인의 뜰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가문 목마름을 견뎠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금 그 시인은 가고 없어도, 그가 가꾼 뜰의 나무는 웅숭 깊은 시의 발자취가 되어 주위에 큰 그늘이 되고 있다.
‘한 줄의 시가 세상을 살립니다’ 지난 해 7월 5일 병마와 싸우다 타계한 故 김종철 시인이 2014년 한국시인협회 회장에 추대되면서 ‘시가 대중을 위해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의 달’을 제정해 ‘시인과 대중이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시협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말이다.
김 시인은 부산 출신(1947년生)이다. 1968년 등단한 이래 현대시의 넓이와 깊이를 탐구하면서 현실성과 예술성 그리고 형이상학성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해 왔다. 그는 지난 2014년 췌장암 선고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정신력과 시에 대한 열정으로 시단(詩壇)에 족적을 뚜렷이 남긴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다.
“제운 밤 촛불이 찌르르 녹아 버린다/ 못 견디게 무거운 어느 별이 떨어지는가/ 라는 영랑 시 <제야>를 좋아합니다. ‘철이 기울거나 늦다’ 또는 ‘참아내거나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뜻을 지닌 ‘제우다’라는 단어는 투병 중에 있던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무겁고 견디기 힘든 시련은 때로는 깊은 통찰의 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절실함으로 낮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시를 쓸 것입니다“_ 故 김종철 시인이 지난 해 임종 6개월 전 병상에 누워 한 말이다.
문학세계사 김종해(시인) 대표의 동생으로, 늘 자기 자신부터 스스럼과 부끄럼 없는 생활로 일관된 생을 살았다. 평소 장삿속이나 잇속이 아닌 진심을 챙기면서 사람과 집단들과 거부감 없이 어울린 문단의 마당발로, 거미줄 같이 얽키고 설킨 문단의 일들을 탓하지 않고 풀어내는 문단에서의 신임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는 ‘시인 선서’ 시에서 ‘시인이여, 절실하지 않고, 원하지 않거든 쓰지말라/ 목마르지 않고, 주리지 않으면 쓰지 말라/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쫓아가라/ 가리지 않고 있지도 않은 것을 다듬지 말라/ 세상의 어느 곳에서 그대 시를 주문하더라도/ 그대의 절실함과 내통하지 않으면 응하지 말라/
그 주문에 의하여 시인이 시를 쓰고 시 배달을 한들/ 그것은 이미 곧 썩을 지푸라기 시이며/ 거짓말 시가 아니냐/ 시인이여, 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대의 심연을 거치고/ 그대의 혼에 인각된 말씀이거늘, 치열한 장인의식 없이는 쓰지말라/ 시인이여, 시여, 그대는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위안하고/ 보다 높은 쪽으로 솟구치게 하는 가장 정직한 노래여야 한다/
온 세상이 권력의 전횡에 눌려 핍박 받을지라도/ 그대의 칼날같은 저항과 충언을 숨기지 말라/ 민주와 자유가 억압 당하고, 한 시대와 사회가 말문을 잃어버릴지라도/ 시인이여, 그대는 어둠을 거쳐서 한 시대의 새벽이 다시 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라/ 그대는 외로운 이, 가난한 이, 그늘진 이, 핍박받는 이, 영원쪽에 서서 일하는 이의 맹우(盟友)여야 한다’ 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지상에서 시의 고결한 진실에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혀 더럽히지 말라는 섬뜩하고 폭풍같은 전언을 선포했다.
‘김대포’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삶 자체가 상처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시라는 것을 미리 아는 빼어난 시인으로, 시대를 여느 시인보다 앞서 증언하고 참회했다.
‘나는 베트남에 가서 인간의 신음 소리를 더 똑똑히 들었다’는 베트남 참전 용사로, 돌아와 1975년 첫 시집 <서울의 유서>를 펴냈다. ‘새벽 두 시에 달아난 개인의 밤과/ 십 년간 돌아오지 않은 오디세우스의 바다가/ 고서점(古書店)의 활자 속에 비끄러매이고/ 우리들 일생의 도둑들은 목마른 자유를 다투어 훔쳐갔다/ 고향을 등진 때늦은 철새의 눈물/ 못 먹이고 못 입힌 죄 탓하며/ 새벽까지 기침이 잦아진 서울은/ 오늘도 모국어의 관절염으로 절뚝이며/ 우리들 소시민의 가슴에 들어와 목을 매었다/_ ’서울의 유서‘ 부분
첫 시집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오이도(烏耳島)>를 펴내고, 1990년 세 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를 펴냈다.
특히 김 시인은 ‘오늘도 못질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삐걱거리지 않게/ 세상의 무릎에 강한 못을 박습니다/ 부드럽고 어린 떡잎의 세상에도/ 작은 못을 다닥다닥 박습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은 당신들은/ 서로 빗나가기만 합니다/ 이내 허리가 굽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굽어진 우리의 머리 위로/ 낯선 유성이 길게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_ ‘오늘도 못질을 합니다’ 전문.
‘사는 법이 못 박는 일 뿐이었다’며 지난 1994년 평생 화두로 잡아 온 <못에 관한 명상> 네 번째 시집을 통해 ‘꿈과 현실적 삶의 괴리’를 표출했다. 우리네 삶과 사회의 아픔과 소망을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담아, ‘속된 삶 또한 깊고 아름다운 것 아니냐(?’)며 ‘못 시리즈’ 연작시를 잇따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지난 2001년 <못에 관한 명상> 연장선상으로 다섯 번째 시집<등신불(等身佛)>을 펴냈다. 2005년에는 형 김종해 시인과 함께 그 유명한 형제시집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펴내 코 끝 시큰한 감동을 부르며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2009년 여섯 번째 시집 <못의 귀향>, 2013년 자신의 살아온 체험과 세계관을 그 특유의 시법으로 아우르며, 아등바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과 사회가 클로즈업되는, ‘밥에서 해방된 천민’이라는 웅숭한 휴머니즘을 노래한 생의 마지막 시집 <못의 사회학>을 출간했다.
“절두산(切頭山)은 성지순례로 가족과 들렀던 곳/ 낮은 나에게도 지상의 집을 사랑으로 주셨다/ 머리가 없는/ 목 잘린 순교(殉敎)의 산/ 오, 나도 드디어 못 하나를 얻었다/ 무두정(無頭釘)/ 부활의 집 지하 3층에서/ 망자와 함께 이제사 천상의 집 지으리라”_ 2014년 유고시집 <절두산 부활의 집> 표제시 부분에서.
지난해 병상에 누워 의식이 떨어지기 전까지 작은딸에게 구술한 유고시집 <절두산 부활의 집>이 문단에 튼튼한 못을 박으며 세상을 향해 걸어나와 유성처럼 사라진 그에게 다시 찬란한 시의 빛을 밝히고 있다. ‘그대 시인이여! 아직 님들이 가지 못한 그 아름다운 길 휘이! 훠이! 가소서. 평안하소서’
이 글은 계간 ‘시와 시학’ 여름호(2015) 제98호에 실린 시인 이경철 전 중앙일보 문화부장의 <우리네 가슴에 박힌 못 모다 빼주고 떠난 김종철 시인>을 참조했습니다.